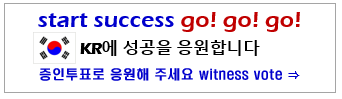바께스 문
바께스 문
고등학교 때였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억지로 앉아 있던 뒷자리의 몇 명이 잡담을 시작한다. 그 또래 애들이 흔히 그렇듯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자신들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마침 복도를 지나다니며 학생들을 지도(감시)하던 선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내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시간까지 집에를 못 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지르는 호통에 섞인 진한 술냄새가 교실에 퍼졌다. 떠든 학생들을 잡아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들고 다니던 대걸레 자루로 벌벌 떠는 엉덩이를 풀스윙으로 후드려 팼다. 중고등학교 때 대걸레 자루로 학생들을 패는 선생들을 볼 때마다 야구나 골프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평소에도 학생들을 엄하게 다뤘던 그는 그날따라 더욱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가 학생들을 때리면서 내지르는 고함소리는 잘못을 꾸짖는 호통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견디지 못한 분통이자 비명으로 들렸다.
그래도 나는 그가 다른 선생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었다. 적어도 그는 장군이나 판검사를 부모로 둔 학생들에게 굽신거리거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고 나름 성실했으며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다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실은 그 선생에 대한 나의 호의적 ‘판단’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아니었을까.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려고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현상. 폭력을 이해하려는 건 결국 폭력에 동조하는 것. 학생의 폭력. 선생의 폭력. 학교의 폭력. 사회의 폭력. 이 세상의 모든 폭력에 대한 순응과 체념.
전교 등수 상위권 학생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특별한 교실에서 자율 학습을 했다. 순위 밖의 학생들이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 된다. 물론 ‘내’가 특별 교실에 올라가면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일반 교실로 내려간다. 특별 교실에서는 대걸레 자루로 맞을 일은 없다. 나는 ‘노력’해서 폭력을 피할 수 있지만 폭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폭력은 언제나 내가 잠시 운좋게 벗어난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_
교실 청소가 끝나고 ‘타율’ 학습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이었다. 쇠창살 같은 창틀 너머로 멀거니 창밖을 구경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보름달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보름달을 쳐다보며 주변에 들릴락 말락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아우우~ 바께스 문~ (Bark at the Moon)~~"
내 근처에 있던 한 친구가 그런 나를 보며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너도 오지 오스본을!”
평소 말수가 적은 점잖은 친구였다. 중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이나 록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었다. 나 역시 그 친구가 반가웠다. 그날 이후 가끔 서로 좋아하는 록앨범들을 주고받으며 음악 얘기를 했다. 그 친구는 내가 추천한 제너레이션 엑스 시절의 빌리 아이돌을 싫어하긴 했지만, 끔찍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 등굣길의 학교 담장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 기억 속의 학교 담벼락은 봉건시대의 성벽처럼 수십 미터 높이로 우뚝 솟아있다. 성 안에는 온갖 폭력들이 꽉꽉 들어차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임계점에 근접한 고농축 된 폭력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하기 위한 거대한 콘크리트 담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문처럼 ‘바께스 문~’을 되뇌었다.
_
덧.
마지막 공연이 될지도 모르는 오지 오스본과 블랙 사바스의 공연 소식을 듣고 이때가 생각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