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스타인웨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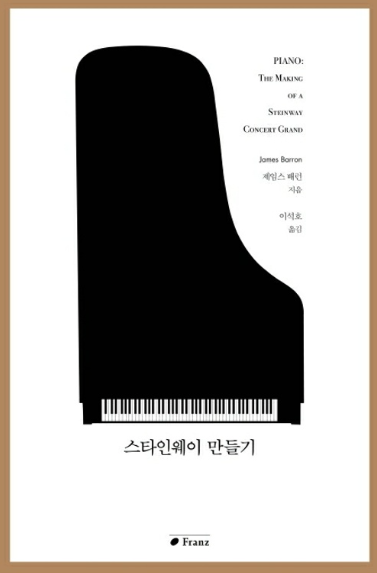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조율할 수 있다. 숙련된 이라면 픽업을 교체하는 등의 부품 손질도 가능하다.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도 자신의 악기를 조율할 수 있고, 심지어 드러머도 탐이나 스네어의 피를 조여 원하는 음고를 맞출 수 있다.
피아니스트는 그럴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러기가 힘들다. 피아노의 건반 수는 88개이고, 건반 한 개에 달린 줄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조율을 위해서는 특수한 도구가 필요하고, 건반의 높낮이나 페달의 작용 범위, 줄이 걸려 있는 핀의 깊이를 조절하려면 전공자의 지식과 기계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아노는 대중적인 악기 중 가장 크고 무겁다. 피아노는 혼자서 들고 옮길 수 없다. 수천 개의 민감한 부품이 들어가기에 조금만 이동해도 이상이 생기기 쉽다. 대체품으로 PCM 방식의 신서사이저를 많이 쓰지만, 그건 피아노가 아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전자 장치다. 피아니스트와 피아노의 일차적 거리감은 여기서 생긴다. 내 악기를 내가 손볼 수 없다는 것. 그걸 만들고 손보는 일은 정작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담당한다. 그 모순이 ‘스타인웨이 만들기’가 소개하는 첫 번째 아름다움이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음악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가장 가치 있는 피아노를 만든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다. 환원주의적 논리로 보여질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사실에서 세상에 상관없는 일이란 없다는 진실을 보았다고 믿는다. 베토벤도 브람스도 슈만도, 나무를 깎고 철을 녹이는 물리적 노동 없이는 재생되지 못한다는 것. 음향학과 물리학과 수학의 조화. 그리고 그 전문적 지식을 수행하는 ‘숙달된’ 노동자 없이는, 피아니스트의 존재도 희미해질 뿐. 열 개의 손가락으로 긴 협주곡을 암보해 전통과 개성을 조화시키는 위대한 마에스트로의 음악과, 먼지가 자욱한 공장에서 나무를 깎고 피아노 줄을 매다느라 울려 퍼지는 소음이 같은 값으로, 적어도 비슷한 값으로 쳐진다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는 상투적 문구나 남발해대는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이다.